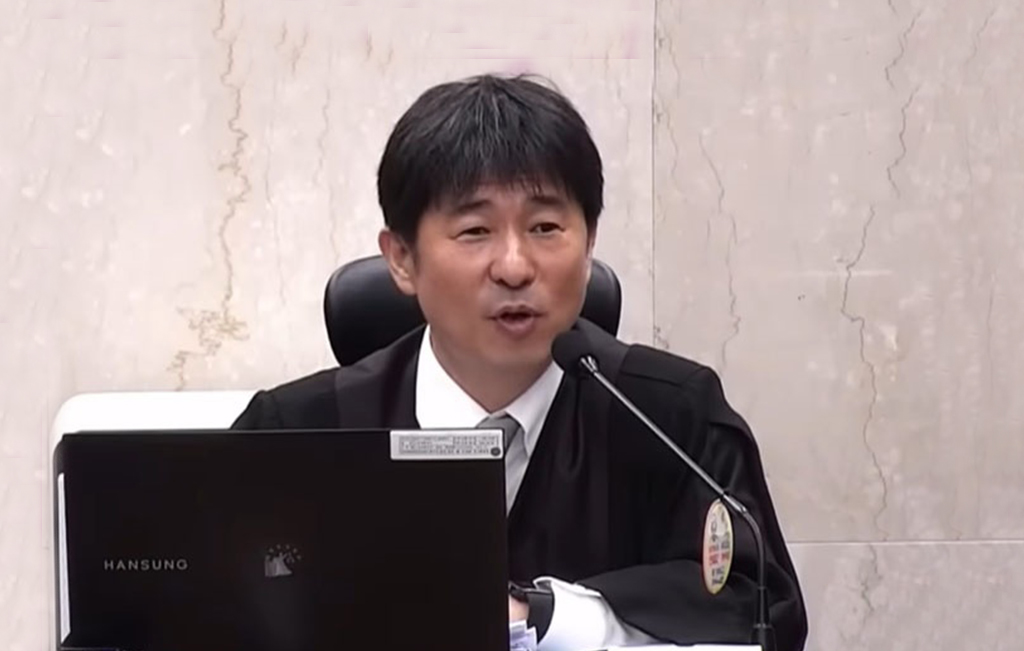
나는 여전히 법원을 바라본다
— 흔들리는 신뢰의 문 앞에서 드리는 기도
“나는 사법부를 신뢰하고 싶다.” 오늘 하루도 이 문장을 마음속에서 여러 번 되뇐다. 이것을 확신처럼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소망에 더 가깝다. 믿고 싶다는 마음과, 흔들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불안이 내 안에서 조용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오래도록 법치주의를 하나님의 일반은총 가운데 하나로 이해해 왔다. 법치주의는 완전하지 않은 인간 사회가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소한의 울타리다. 그래서 나는 법원을 쉽게 비난하지 않으려 애써 왔다. 재판관의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무거운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 속에서, 나는 그 울타리가 과연 여전히 단단한지 스스로 나 자신에게 묻게 된다. 다가오는 판결 하나가 단순한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드러낼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마음은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고 무겁다.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믿는다. 법은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사실과 요건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구성요건과 증명이 분명해야 한다. 특히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라면, 그 판단은 더욱 엄밀해야 한다. 법이 상식의 땅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순간, 시민의 마음이 법정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나는 스스로 나 자신에게 경고한다. 우리가 보는 사실의 전부를 아직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겸손을 잃지 말자고 말이다. 법정은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조각난 장면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와 증언 속에서 판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고 말하고 싶다. 나는 신뢰가 무비판적 동의가 아니라,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라고 배워 왔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단정하기보다 기도한다. 재판관들이 어떤 압력보다 사실과 법리에 더 깊이 귀 기울이기를 소원한다. 정치의 소음이 아니라, 양심의 낮은 목소리를 따라 판단하기를 간구한다. 그들의 펜 끝이 어느 한쪽의 기대가 아니라, 법 그 자체를 향해 움직이기를 희망한다.
나는 이 나라가 법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 사법부가 정치의 도구로 의심받는 순간, 공동체의 신뢰는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역사 속에서 보고 또 배워왔다. 법원이 마지막까지 법원으로 남아 있을 때에만,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기독교 영성은 상처 입은 세상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성급한 결론보다 오래 머무르는 믿음이 필요하다. 지금은 단정하고 성급하게 판단할 시간이 아니라, 분별과 인내의 시간일지도 모른다.
나는 여전히 대한민국 사법부를 신뢰하고 싶다. 그 신뢰가 순진함으로 끝나지 않고, 정직한 판단에 따라 지켜지기를 바란다. 며칠 뒤에 다가 올 전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누구의 기대를 만족시키느냐보다, 법 앞에 서도 부끄럽지 않은 결정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서로 다른 견해와 이해을 따르더라도 적어도 한 가지는 함께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 나라는 아직 법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 아래의 SNS 아이콘을 누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붓과 말 사이: 흔들리는 대한민국 정치 풍경
붓과 말 사이: 흔들리는 대한민국 정치 풍경













